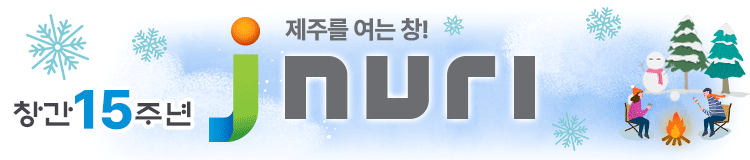요즘 들어 어머니의 치매증세가 몹시 깊어지는 듯하다. 섬망 증세가 있으신 듯, 20여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자주 찾으신다.
“니네 아방은 어디 가시니? 밥이나 먹어점신가 이? 아방은 밥에 촘지름을 듬박허게 뿌령(참기름을 충분하게 뿌려서), 독새기 두 개만 깨엉 잘 저서주민(달걀 두 개만 깨서 잘 저어드리면), 호루 종일 밭갈쇠영 굳짝 일을 허는디(하주 종일 밭 가는 소와 함께 계속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걱정이신 건, 그만큼 보고 싶은 그리움이 사무치신 게다. 워낙 체격이 좋으신데다가 술 담배를 안하시던 아버지는 남편을 여의고서 밭 갈 일이 태산인 우녁집에서 부탁을 해오면, 우리집 일을 제쳐놓고 새벽같이 소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쯤 우녁집 아지망이 마련해 놓은 점심 구덕을 펼치면, 까만 꽁당보리밥에 된장과 풋배추가 들어 있었다. 이 밥으로 어떻게 허기를 때우고서, 사래 긴 저 돌짝밭을 저녁까지 갈아치울 것인가?
아버지는 이마의 땀을 닦으면서 당신이 들고 간 보자기를 펼치셨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정성으로 반질거리는 참기름과 계란 두 개가 들어 있었다. 얼굴이 화안해진 아버지는 밥에다 참기름과 계란을 넣고, 배추를 손으로 잘라서 함께 비비셨다. 아, 그 꿀맛이 뚝뚝 떨어지는 비빔밥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어떻게 그 1960년대의 보릿고개 속에서, 어머니는 계란을 다 챙기셨을까? 그때는 학교 가는 길에 계란을 들고서 가게에 가면 학용품을 살 수 있었다. 계란은 곧 물물교환이 가능한 화폐와 마찬가지였다. 어머니의 그러한 투자에 힘입어서 아버지는 대포마을에서 가장 힘이 세고 일을 잘하는 장년이었다.
그처럼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어머니의 가슴을 포근하게 적셔주는 봄비와 같았다. 그런데 엊저녁에는 “어머니, 무사 날 낳읍디가?”라며 울먹이는 소리로 벽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외로우신 거다. 온 몸이 저리신 게다.
요즘 들어 어머니는 하루 종일 주무시다가 저녁에야 겨우 눈을 뜨시기도 하신다.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심지어 눈거풀을 뒤집어도 속수무책 숨만 쉬신다. 걱정이 돼서 여기저기 전화를 걸면, ‘그냥 가만히 놔 두라“는 게 답이다. 기운이 차면 눈을 뜨실 것이고, 살아나실 거면 밥을 드실 거란다. 한 두 번 겪는 일이 아닌데도, 나는 이 봄에 어머니로 인하여 울고 또 웃는다.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그야말로 인생의 봄과 같은 포근한 동반자였다. 때로는 새싹처럼, 때로는 풀꽃처럼, 어쩌면 흐드러지게 피는 목련과 벚꽃처럼 어머니는 어머니의 온 세상이었으리라. 다섯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막내딸이 되어 그 슬픔의 중심을 함께 살아내셨으니, 오죽이나 살갑고 아깝고 서러웠으랴.
할아버지는 4.3 못지않게 비통함이 온 마을을 휩쓸었던 함경환 사건으로 돌아가셨다. 1928년 정월 초닷새, 어머니가 5살 적 일이다. 중문면에서만 32명이 한꺼번에 익사했는데, 그 장소가 우리 마을 대포 바다(주상절리)가 가까운 코지 근방 몰레바당이었다. 남편을 잃고서 바람만 불면 바닷가로 나가서 혹시나 신발이나 옷가지, 무슨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헤매던 그 어머니의 슬픔을, 막내딸이 가장 서럽게 애닯게 느꼈으리라. 남편을 찾아서 대포바당 전체(지삿개, 주상절리 해역)에서 배튼개(약천사) 지경을 해매어 다니다가 맨손으로 들어온 밤이면, 막내딸을 부둥켜 안고 숨죽이며 울었으리라. 잊고 싶지 않은 기억을 잊어야 하는 것은 슬픔이자 병이지만, 잊고 싶은 기억을 잊을 수 없는 것은 설움이자 아픔이다.
엊그제는 아침 7시 20분, 청주행 비행기를 타고 대전까지 가서 회의를 할 일이 있었다. 서귀포에서 새벽 5시 30분, 심야 버스를 타고 공항까지 달려가는 길에 어머니가 눈에 밟혀 목구멍이 얼얼해 왔다. 가슴 또한 묵직해져서 이러다가 멀미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눈을 감고 잠을 청하였다.
얼마쯤 지났을까. 꿈 같지 않은 선명한 풍경이 펼쳐졌다. 외출했다가 부리나케 집으로 달려와서 “어머니!” 하고 부르며 방문을 열었는데, 횡 하니 비어 있는게 아닌가. 이부자리만 주인을 잃은 채 쓸쓸하게 펼쳐져 있다. 아,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을까? 몹시도 떨리는 가슴을 부여안고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신단다. 아, 괜찮으시구나. “어머니를 부탁해요. 눈동자처럼 단단히 지켜봐 줍서!”라고. ‘눈동자처럼 단단히’라는 표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며 책임져주시기’를 간구할 때 쓰는 표현이다.
어머니가 102세 생신을 지내시고 103세의 길을 걷고 계신 지금, 나는 왜 이토록 불안하고 걱정스러운가? 어머니는 여전히 “살려줍서!”를 입에 달고서, 하루 세끼 식사를 단단히 챙겨 드시는데 말이다. 지금도 지난밤 바람에 밀려온 미역을 빨아서 식탁에 놓아두었는데, 어느새 다가가서 한 줄기를 가져오셨다. 간장을 달라시면서 맛있게 드시는 어머니는, 영락없는 제주 해녀이시다. 아침에 바닷가를 살피시다가 미역을 보시고서 그렇게 좋아하시던 할머니도 보목 마을 전직 해녀이시다. 작년에는 한 톨도 없이 씨가 말랐던 미역이, 올해는 더러 파도에 밀려와서 반가움을 더해준다. ‘살암시민 살아진다’라는 제주도 어머니들의 인생 모토처럼, 자연은 생명의 본능과 순리를 따라 살아내며 살아간다. 자연의 은혜다.
어머니의 치매증세가 깊어짐은, 옷을 계속 겹쳐 입어서 눈사람처럼 거동이 불편할 지경에 이름을 보면서 느낀다. 아무데나 침을 뱉는 등의 신체적 문제는 내가 곁에서 돌봐드리면 되는 일이다. 어머니가 움직이면 동시에 뛰어가서 이인삼각(二人三脚)을 해온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지 않았는가.
92세부터 요양원 주간보호 서비스를 받기 시작해 98세쯤 ‘이제는 더 이상 주간보호로는 돌보아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통지를 받고서부터 집에서 함께 생활해 왔다. 이쯤 되면 어머니와 나는 둘이 하나처럼 되지 않았나 싶다. 주어진 길을 함께 걸어가면 되리라. 지난 3월 22일 만 102세 생신을 보내고, 이제는 103세를 가고 있으니..., 천국의 계단을 오르듯 천천히 걸어가면 되리라.
매년 4월 11일은 '세계 파킨슨병의 날'이다. 파킨슨병을 의학적으로 처음 규명한 제임스 파킨슨 박사의 업적을 기리고, 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의료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주요 증상은 1) 떨림(진전): 주로 편한 자세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몸이 떨림. 2) 경직: 초기에 근육이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이 나타남, 3) 서동: 행동이 느려지는데, 단추를 끼우거나 글씨를 쓰는 작업과 같이 미세한 움직임이 점점 둔해짐, 4) 자세 불안정: 몸의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넘어짐, 5) 구부정한 자세: 목, 허리, 팔꿈치, 무릎 관절이 구부정하게 구부러짐, 6)보행 동결(보행이 어려워짐) 등이다.
문득 나를 돌아보니 어머니의 치매를 같이 겪으면서 어느새 UN이 규정한 만 65세 노인이 되었다. 어머니 덕분에 인생을 고즈넉하게 바라볼 수 있는 황혼이 낯설지 않다. 치매도 하늘이 허락하신 거라면 담담히 손잡고 가시려는 어머니의 천진난만한 얼굴이 아기처럼 해맑다. 세 살쯤 되었을까....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허정옥은?
= 서귀포시 대포동이 고향이다. 대학 진학을 위해 뭍으로 나가 부산대 상과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경영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미국 볼티모어시에 있는 University of Baltimore에서 MBA를 취득했다. 주택은행과 동남은행에서 일하면서 부경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이수했고, 서귀포에 탐라대학이 생기면서 귀향, 경영학과에서 마케팅을 가르치면서 서귀포 시민대학장, 평생교육원장,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2006년부터 3년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의 대표이사 사장과 제주컨벤션뷰로(JCVB)의 이사장 직을 수행한데 이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을 거쳤다. 현재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서비스 마케팅과 컨벤션 경영을 가르치고 있다.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좀녀학교도 다니며 해녀로서의 삶을 꿈꿔보기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