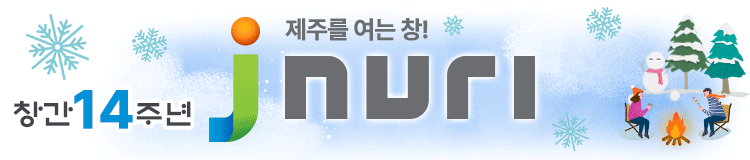요즘 들어 어머니의 잠꼬대가 부쩍 늘었다. ‘허태행씨, 허태행씨....’라면서 아버지를 찾는 소리도 훨씬 잦아졌다. 잠꼬대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일기장에 기록해 놓는다. 지난 8일에는 “아고, 우리 어머니 어디 가시니게?”라고 당신의 어머니를 찾으신다. 달력을 보니 어버이날이었다. 어머니의 잠꼬대는 그냥 헛소리가 아닌 게다.
오늘 새벽에는 “논에 물 대라, 제게 제게(빨리 빨리)! 우리 논 차례여, 이!” 하시며 허공에다 두 팔을 휘저으신다. 여간 급하고 간절하신 게 아니다. 혹시나 싶어서 인터넷을 뒤져보니, 아하, 요즘이 모내기 철이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의 잠꼬대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신 거다. 102년을 살아오시면서 오랫동안 몸에 축적된 습관과 예감의 발로다.
우리 논이란 게 남의 논을 병작하는 것이다 보니, 농사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곳이 아니었다. 대포마을 약천사 근처의 선궷내 물을 따라 형성된 논들은 층층이 계단식에다 면적이랄 것도 없는 조각난 땅들이었다. 지금 와서 그곳을 바라보면, 어떻게 저기를 논으로 삼고서 농사지을 생각을 다 했을까 싶다.
특히 우리 식구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낑낑 거리면서 논일을 했던 곳은 낭떠러지에 물이 떨어지다 보니 흙도 좀 밀려나서 어쩌다 논 비슷한 구석이 생겨났지 싶다. 그것을 우리 부자 이모님은 동생에게 병작을 주었고, 그마저도 아쉬운 어머니는 2남 7녀 중 4, 5, 6번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벼를 심었다.
5번 언니 말에 의하면, 가을이 되어 추수할 때가 되면, 이모님이 오셔서 대장질을 하셨단다. 우리가 열심히 벼를 베면, 아버지가 한 묶음씩 묶어서 볏단을 만드시고, 한 단씩 풀어서 탈곡기에 넣으셨다. 그러면 거기에서 쏟아져 나온 벼를 멍석에다 쌓아놓고, 어머니가 ‘이모님네 포대 하나, 우리 포대에 하나’ 씩 나눠 놓으셨다. 그러다가 포대에 들어갈 정도가 아닌 만큼 남으면, 이모님이 됫박을 주면서 나누라고 했단다. 어머니는 그마저도 됫박으로 나누다가 마지막 남은 두어 줌은 이모님 포대에 다 털어 넣으셨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바알갛게 상기된 어머니의 얼굴이 6번인 내 눈에도 그렇게 해쓱해 보일 수가 없었다. 언니도 그때 일이 서러운 듯 어머니 앞에서 한 소리를 해댄다. ‘내가 언니라면, 동생네는 2남 7녀에 시어멍 시할망에 열 세 식구니, 어떻게든 동생이 먹고 살라고 한 포대쯤은 덤으로 줄 것 같은데...’라고.
그러고는 지금은 그 일을 기억도 못 하는 어머니를 얼싸안으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듯 속삭인다. “우리 어머니, 우리들 먹여 살리젠 허난, 잘도 고생해수다, 예! 어머니 정말 고맙수다. 덕분에 우리는 고등학교 마당에도 다 가보고, 농사 안 허는 집에 시집간 이추룩 한글허게(한가하게) 놀멍 놀멍 살아졈수다.” 어쩌다 오늘은 글마저도 삼천포로 빠져들까?
지난달에는 고향 마을 대포마을에 98세 노인의 장례식이 있었다. 어머니와 그다지 친밀한 사이는 아니지만 ‘누구’라면 알 수 있는 분이셨다. 장례식에 가기 전에 집을 나서면서 고인의 성함을 얘기해 드렸다. 그때 어머니의 쓸쓸한 표정이 아직도 가슴 서늘하게 눈가를 맴돈다. “저승길은 짝을 지엉 가살 건디(짝을 지어서 가야 할 건데)....”. 말끝을 채 맺지 못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고인의 가시는 걸음을 걱정하시는 건지, 당신의 앞날을 염려하시는 건지 모를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머니는 아직 그분의 벗이 되어서 저세상으로 걸어가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다. 오늘 아침에도 ‘건강, 건강’을 중얼거리시면서, 고등어에 미역 된장국을 곁들여 잡곡밥을 한 공기 다 드셨으니까. ‘살려줍서, 살려줍서’라는 기도를 입에 달고 사시니, ‘밥만 잘 드시면 오래오래 살아집니다, 예!’라고 최면을 단단히 걸어 드린다.
거기에 더해서 “어머니, 드러 잘 먹는 디 죽는 사름 보십디강?” 하면서 어머니 엄지에 손도장도 찍어드린다. 빙그레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어머니는 영락 없는 세 살 아기다. 아, 우리 어머니 김성춘 여사님은 그 이름 성춘(成春)처럼 당신 여생의 황혼 녘에서 봄을 활짝 이루면서 살아가시리라.
사실 엊저녁까지도 기운이 하나 없으셔서, 그 좋아하는 보말을 한 사발 갖다 드려도 쳐다보지를 않으셨다. 내심 걱정이 되어 밤새 뒤척였다. 다행히 오늘은 다섯물이지만 평소보다 썰물이 많이 나가서, 어머니가 눈독을 들일 만큼 보말을 잡을 수가 있었다.

아 참, 바다의 물 때는 보름을 기점으로 해서 한 물에서 14물까지 센 후 15일 째는 ‘조금’이라 하고, 다시 1물로 시작해서 나머지 반 달을 채운다. 조금은 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점이다. 요즘은 바다가 오염이 돼서 그런지 예전만큼 보말들이 올망졸망 기어나오지를 않는다. 애써 돌을 일으켜 보아도 어머니가 눈을 주실 만큼 괜찮은 것들은 가뭄에 콩 나듯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어느 정도 자라서 이동할 힘이 있는 보말들은, 더 신선한 물과 먹이를 찾아서 더 먼 바다로 자리를 옮겼을 터다. 게다가 중국에서 몰려왔다는 갱생이 모자반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썰물에 바닷물이 말라붙은 자갈밭에서는 보말들도 숨쉬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듯하다.
다행히 어머니가 잡초인 줄 알고 뽑다가 꺾어서 내버린 접시꽃에서 꽃이 피어났다. 기적이다. 아, 꽃은 이토록 예쁘고 귀하게 보이는데도, 어쩌면 이리도 모질도록 끈질긴가. 접시꽃의 분투를 보니, 어머니를 닮은 듯 어여쁘고 강인하다. 인생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모습이 제주도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
이쯤에서 아내를 그리워하며 썼다는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의 일부를 적어본다.
‘접시꽃 당신_도종환(1955~)’
옥수수잎에 빗방울이 내립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낙옆이 지고 찬바람이 부는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은
참으로 짧습니다.
<중략>
옥수수잎을 때리는 빗소리가 굵어집니다.
이제 또 한번의 저무는 밤을 어둠 속에서 지우지만
이 어둠이 다하고 새로운 새벽이 오는 순간까지
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 곁에 영원히 있습니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허정옥은?
= 서귀포시 대포동이 고향이다. 대학 진학을 위해 뭍으로 나가 부산대 상과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경영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미국 볼티모어시에 있는 University of Baltimore에서 MBA를 취득했다. 주택은행과 동남은행에서 일하면서 부경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이수했고, 서귀포에 탐라대학이 생기면서 귀향, 경영학과에서 마케팅을 가르치면서 서귀포 시민대학장, 평생교육원장,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2006년부터 3년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의 대표이사 사장과 제주컨벤션뷰로(JCVB)의 이사장 직을 수행한데 이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을 거쳤다. 현재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서비스 마케팅과 컨벤션 경영을 가르치고 있다.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좀녀학교도 다니며 해녀로서의 삶을 꿈꿔보기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