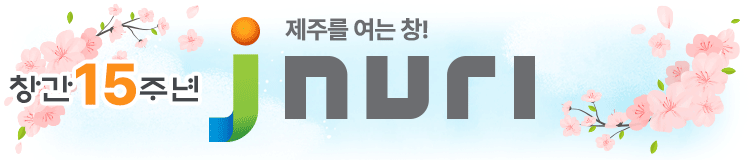중국의 전통 의약학(醫藥學)은 역사가 유구하다. 집단주의적 관념(인체의 각 부분이 전체 유기체를 구성하는 정합(整合)된 것으로 보는 관념), 변증론치(辨證論治)1), 예방과 치료의 결합(예방치료)에 뛰어나다. 현재 보이는 상(商)대 복사(卜辭) 중의 현존하는 질병에 대한 기록은 500여 항목이나 된다.
 서주(西周) 때에는 의학이 ‘천관총재(天官冢宰)’에 속했다. 식의(食醫), 질의(疾醫, 내과), 양의(瘍醫, 외과), 수의(獸醫) 등 여러 과가 있었다. 의사는 의정(醫政)을 모두 관리하였다.
서주(西周) 때에는 의학이 ‘천관총재(天官冢宰)’에 속했다. 식의(食醫), 질의(疾醫, 내과), 양의(瘍醫, 외과), 수의(獸醫) 등 여러 과가 있었다. 의사는 의정(醫政)을 모두 관리하였다.
이후에는 민간에서 사의(私醫)가 명성을 떨쳤다. 『사기·편작창공열전(扁鵲倉公列傳)』의 기록을 보면 춘추시대 때에 진월인(秦越人, 편작)이 내과 수술에 능했고 대하의(帶下醫, 부인과), 소아과, 이목(耳目) 비병(痹病)의 등을 겸했다. 모두 “각지의 인정 풍속에 맞추어 진료 과목을 바꾸었다.”(隨俗爲變)
전통 중의학은 민간에서 생겨났기에 역대로 유방랑중2)이 강호를 떠돌아다니면서 의술을 행하고 약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중의학은 가전(家傳) 풍습이 있다.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인연이 생기면 의약 기술을 배우거나 관련 지식을 얻는 경우도 있었다. 옛날 약방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전문적인 한의사가 아니라 대부분 의약 지식이 있어 질병을 진단하고 약을 조제하였다.
이러한 중국민족문화 중에서 그러한 의약학 문화전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술을 행하고 약을 팔면서 구걸하는 거지 부류가 생겨난 것도 기이한 일은 아닐 터이다.
약방에서 약을 조제하는 사람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약을 캐고 약을 심으며 약을 만드는 약농(藥農), 약공(藥工)도 거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가전비방을 배운 사인이나 관리도 생활이 곤궁해져 초라하게 되거나 환란에 빠지게 되면 자기 기술을 펼치면서 걸식하거나 돈을 버는 것은, 그저 길거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동냥하는 거지보다는 그나마 용이하기도 하였고 떳떳하기도 하였다.
 『후한서·방기전(方技傳)』 기록을 보자 :
『후한서·방기전(方技傳)』 기록을 보자 :
곽옥(郭玉)이라는 광한(廣漢) 낙성(雒城) 사람이 있었다. 그의 부친은 부수(涪水)에서 고기를 자주 낚았기에 부옹(涪翁)이라 불렸다. 민간에 은거하며 구걸하면서 질병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침술로 치료해 줬다. 나중에 『침경진맥법(針經診脈法)』을 저술하여 제자 정고(程高)에게 전해주었다. 정고도 은거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공명도 쫓지 않았다.
곽옥은 어릴 적부터 정고를 따라다니며 방진(方診, 처방과 진찰) 육징(六徵)3)의 기술과 ‘음양의 변화를 헤아릴 수 없다(陰陽不測)’의 법술을 배웠다. 나중에 궁중의 태의승(太醫丞)이 됐을 정도로 의술이 뛰어났다. 그럼에도 그는 어질었고 자신의 재능을 뽐내지 않았다. 빈천한 하층민에게도 전심전력으로 병을 치료하다가 임지에서 죽었다.
곽옥의 부친은 의술을 행하며 구걸하였다. 곽옥도 명성을 얻어 관리가 됐으면서도 여전히 가풍을 지키며 가난한 병자를 멸시하지 않았다. 인품과 의술 모두 뛰어났다.
적어도 한(漢)대에 이르면 중국 민간에 의술을 펼치며 구걸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송대 소박(邵博)의 『소씨문견후록(邵氏聞見後錄)』 29권 기록을 보자 :
송대 소박(邵博)의 『소씨문견후록(邵氏聞見後錄)』 29권 기록을 보자 :
정사보(鄭師甫)는 종아리에 부스럼이 났다. 물이 들어가자 너무 부어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다. 거지가 귀지로 부스럼에 바르자 하룻밤 사이에 물이 흘러나오고 부스럼도 완치되었다.
책에는 너무 간단하게 30여 자의 기록밖에 없고 정사보의 자술이기에 그 거지에게 어떤 포상금으로 사례했는지도 서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술된 상황을 보면 의술을 행하며 구걸하는 거지라 판단할 수 있다.
명대 황희수(黃姬水)의 『빈사전(貧士傳)』 하권 『왕규(王逵)』의 기록을 보자 :
왕규의 자는 지도(志道), 전당(錢塘) 사람으로 한쪽 발을 절었다. 집안이 가난하여 하루 세 끼니를 잇기가 어려워서 약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나중에 계속해 약을 팔 수 없자 점을 쳐주면서 살아갔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사람을 위하여 근심을 덜어주고 곤란을 해결해 주었다.
이처럼 왕규는 약을 팔면서 구걸하였을 뿐 아니라 점술을 이용하여 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던 거지였다.


고대에 강호에서 의술, 점술, 점성술, 관상을 봐주는 것을 ‘방기(方技)’라 하였다. 『사기·창공전(倉公傳)』에 “방기에 뛰어나고 능히 병자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한서·예문지』는 말한다.
“방기(方技)라는 것은 모두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니, 왕이 설치한 관직 가운데 하나인 직무다. 태고에 기백(岐伯), 유부(俞跗)가 있었고 중세에는 편작(扁鵲), 진화(秦和),……한이 흥하자 창공(倉公)이 나타났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모두 강호 방기 중의 의술이다. 나중에 강화 사회에 네 가지로 나뉘었는데 그중 하나가 의술을 행하고 약을 파는 부류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1) 변증론치(辨證論治), 각종 증상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치료를 결정한다는 한의학 이론이다. ‘증(證)을 변별하여 치료를 논한다’는 뜻으로, 한의학에서 질병을 인식하고 치료하는 기본원칙이다. 한의학에서는 병명에 관계없이 우선 증(證)을 살핀다. 증은 증후군(證候群)이라고도 할 수 있다. 환자로부터 얻은 정보들, 즉 질병의 원인이나 부위·성질·신체적 여건 등의 증후군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치료를 한다는 이론이다. 변증시치(辨證施治), 변증론치(辯症論治)라고하기도 한다.
2) 주방랑중(走方郎中), 떠돌이 의생(醫生), 주랑중(走郎中), 유방랑중(游方郎中), 영의(鈴醫), 초택의(草澤醫), 주의(走醫)라고도 한다. 옛날 유학(遊學)하며 의술을 행하고 약을 팔며 사방을 주유했던 사람을 가리킨다.
3) ‘방진(方診)육징(六徵)’은 의방(醫方), 진법(診法)과 3음3양(三陰三陽)의 맥상(脈象)을 판별하는 의법(醫技)이다. 육미(六微)〔육징(肉徵)〕에 대해 청대 심흠한(沈欽韓)은 《양한서소증(兩漢書疏證)》에서 말했다. “육미(六微)는 3음3양(三陰三陽)의 맥후(脈候)다.” 《소문(素問)》 《육미지대론편(六微旨大論篇)》에 요지암(姚止庵)의 해제에 말했다. “하늘에는 육기(六气)가 있고 사람에게는 3음3양(三陰三陽)이 있어 상하가 상응한다. 변화는 여기에서 생겨나고 질병은 여기에서 일어난다. 그 뜻이 지극히 미묘하기에 육미지대론(六微旨大論)이라 하였다.” ‘육미(六微)’는 의도(醫道)를 가리킨다. ‘육미(六微)’는 ‘육징(六徵)’이라하기도 하는데 여섯 가지 징후를 가지고 병을 진단하는 법이다.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 대만 정치대학교 중문학과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자로 『선총원(沈從文) 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 『재미있는 한자풀이』, 『수달피 모자를 쓴 친구(선총원 단편선집)』, 『음식에 담겨있는 한중교류사』, 『십삼 왕조의 고도 낙양 고성 순례』, 『발자취-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가는 여정』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