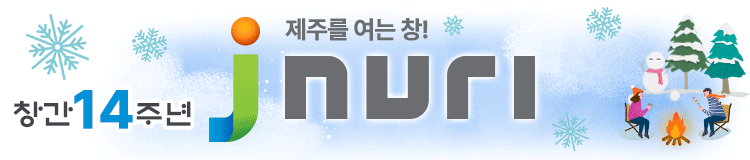곡조에 맞춰 대나무판, 목판, 소 갑골(胛骨)과 같은 종류를 손에 들고 다니기도 했다. 타악기나 간단한 악기 종류로 반주하면서 입으로는 상응하는 가요, 곡사를 음송하거나 연창하면서 구걸하였다. 흔히 보이는 여러 형식은 다음과 같다.
 대나무판(竹板)을 치면서 구걸하는 방식이다.
대나무판(竹板)을 치면서 구걸하는 방식이다.
‘고답판(呱嗒板儿, 박판)1)을 연주하는 거지’다. 현재에도 자주 보이는 구걸 방식이다.
대나무판을 치면서 구걸하는 방식이 언제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고증하기는 쉽지 않다. 복건성 서쪽 객가인(客家人)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유행하였고 2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고 전한다.
대나무판은 길이 18센티미터, 넓이 3센티미터 정도, 두께 0.5센티미터, 서넛 조각을 줄로 연결시켜서 만든다. 양손에 들고 다니고 오른 손에는 두 조각을 잡는다. 상반부는 톱니 형태다.
타법은 단타법, 잇달아 끊이지 않게 치는 법, 톱을 켜듯 긁어 소리 내는 법 등이 있다. 한 손에 대나무판 두 쌍을 함께 잡고 다른 손에는 여러 대나무판을 엮어 만든 ‘쇄취자(碎嘴子)’를 잡고, 손가락 사이에 이빨 형태의 대나무막대를 끼워서 연주하기도 한다.
각 지역마다 유행하는 형태와 연주법이 각각 다르다.
연주하면서 말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한다. 창사는 7언 5구나 7언 4구가 주를 이룬다. 객가(客家) 지역은 5구가 주를 이루어서 ‘오구판’ 혹은 ‘오구락판(五句落板)’이라 부르기도 한다.
거지들이 구걸하려고 기예를 파는 방식이기에 ‘걸식가(乞食歌)’, ‘고화가(告化歌)’, ‘강호조(江湖調)’라 불리기도 한다. 나중에는 민간 곡예의 곡종(曲種)으로 발전하였다.
물론 아직도 길거리에서 연주하면서 구걸하고 시장에서 기예를 팔아 음식과 바꾸는 거지의 생계유지 수단임은 분명하다.
하북과 산동 일대에서 유행하는 ‘염산(鹽山) 죽판서(書)’, ‘임구(任丘) 죽판서’ 등 곡예의 곡(曲)도 원래 거지들이 하던 ‘창가(唱街)’, ‘흘가(吃街)’나 혼례를 거행할 때 부르는 ‘희가(喜歌)’의 구걸 방식에서 나와서 나중에 점차 민간 곡예 예술품으로 변화된 것이다.
청나라 동치, 광서 연간에 북경에서 유명한 민간 설창 예인인 주소문(朱少文)이 북경 천교 등에서 노점을 차릴 때마다 대나무판을 두드리며 말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는 형식을 채용하였다. 그가 사용하는 대나무판 한쪽에는,
“하루에 천이나 되는 집의 밥을 먹고 밤에는 옛날 사당에서 잠을 자네.”
다른 한쪽에는,
“법을 범하지 않으니 무슨 군왕을 만날까 걱정하랴.”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런 ‘궁불파(窮不怕)’(궁핍해도 두렵지 않다)라는 예명의 설창 예인도 기예를 팔면서 구걸하는 거지와 다름없었다. 거지나 예인이나 원래 그게 그거였다.
사실 예인(藝人)이란 현재에도 여러 가지 기예를 닦아 남에게 보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배우, 만담가, 곡마사와 같은 사람을 이른다고 하지 않는가.
연화락(蓮花落)을 연주하면서 구걸하는 방식
 거지가 ‘연화락(蓮花落)’을 연주하면서 구걸하는 방식은 송나라 때에 이미 출현하였다. ‘연화락’의 원래 한자는 ‘연화락(蓮花樂)’이다. ‘락(落)’은 ‘락(樂)’의 전음이다. 불교 어록 『속전등록(續傳燈錄)』 제23 「유도파(兪道婆)」의 기록이다.
거지가 ‘연화락(蓮花落)’을 연주하면서 구걸하는 방식은 송나라 때에 이미 출현하였다. ‘연화락’의 원래 한자는 ‘연화락(蓮花樂)’이다. ‘락(落)’은 ‘락(樂)’의 전음이다. 불교 어록 『속전등록(續傳燈錄)』 제23 「유도파(兪道婆)」의 기록이다.
“하루는 거지가 「연화락(樂)」을 읊는 소리를 들었다. ‘유의(柳毅)가 편지를 전하지 않았는데 무슨 까닭에 동정호에 왔는가.’ 갑자기 대오하였다.”
송나라 때 승려 효영(曉瑩)의 『나호야록(羅湖野錄)』 권2의 기록이다.
“금릉에 유도파가 있다. ……하루는 거지가 「연화락(樂)」을 시장에서 읊었다. ……갑자기 깨달아 자기도 모르게 크게 웃었다.”
두 가지 기록 모두 ‘연화락(蓮花樂)’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나중에는 ‘연화락(落)’으로 기록된다.
예를 들어 『고금잡극(古今雜劇)』에 기록된 원나라 때 장국빈(張國賓)의 「합한삼(合汗衫)」극 제1절이다.
“이 높은 저택은 분명 착한 사람의 집일 터이니. 달리 방도가 없으니, 내가 「연화락(落)」을 불러 먹을 밥을 구걸하여야겠다.”
진간부(秦簡夫)의 「동당로(東堂老)가 파산한 자제에게 권하다」 극 제1절의 기록이다.
“너 젊어서 북채를 휘두르지 말고 「연화락」 연구하는 걸 배우라.”
정정옥(鄭廷玉) 『포대화상인자기(布袋和尙忍字記)』의 설자 기록이다.
 “대부호가 아닌가? 내가 먹을 차나 밥이 있는지 물어보리라. …… 「연화락」을 불렀노라. 1년 봄이 다 지나니 1년 봄이 오도다.”
“대부호가 아닌가? 내가 먹을 차나 밥이 있는지 물어보리라. …… 「연화락」을 불렀노라. 1년 봄이 다 지나니 1년 봄이 오도다.”
지금은 모두 ‘연화락(落)’이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쓰든 간에 ‘연화락’이라는 말은 쓰기 시작할 때부터 예외 없이 생계를 유지하려고 구걸하는 수단이었다.

거지가 곳곳으로 돌아다니기에 유동성이 강하다. ‘연화락’도 통속적이었다. 쉽게 공연할 수 있고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는 설창 예술 형식이어서 광범위하게 유행하였다.
이제는 ‘연화락’이 최초에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지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1) 고답판(呱嗒板儿), 박판으로 중국 전통극인 쾌판을 할 때 리듬을 맞추는 악기로, 대나무 조각 두 개를 끈으로 묶어져 있는 형태다.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 대만 정치대학교 중문학과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자로 『선총원(沈從文) 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 『재미있는 한자풀이』, 『수달피 모자를 쓴 친구(선총원 단편선집)』, 『음식에 담겨있는 한중교류사』, 『십삼 왕조의 고도 낙양 고성 순례』, 『발자취-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가는 여정』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