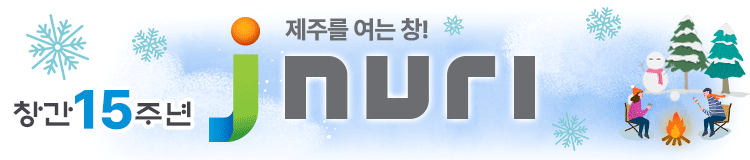운남(雲南)의 요안(姚安), 대요(大姚), 경안(景安) 등지에서 유행하는 ‘요안 연화락’은 청나라 함풍, 동치 연간에 사천(四川)의 거지가 전래했다고 한다.
 강서(江西) 대부분 지역에서 유행하는 ‘강서 연화락’(일명 ‘타(打)연화’)은 강소(江蘇), 절강(浙江)에서 강서로 가서 구걸하던 거지가 전했다고 한다.
강서(江西) 대부분 지역에서 유행하는 ‘강서 연화락’(일명 ‘타(打)연화’)은 강소(江蘇), 절강(浙江)에서 강서로 가서 구걸하던 거지가 전했다고 한다.
호남(湖南) 각지에서 유행하는 ‘연화뇨(鬧)’는 외성의 거지가 구걸하면서 호남으로 흘러들어가 전파했다고 한다.
호남에서 즉흥적으로 작사하고 편곡하는 구걸 형식과 공연 예술은 악곡(樂曲)체와 시찬(詩贊)체로 나뉜다.
형산(衡山) 일대에서 유행하는 형식은 악곡체로, 연창 때에 말을 위주로 하고 노래가 뒷받침 한다. 말을 하면서 압운하고 판을 치면서 박자를 맞춘다. 노래는 친자(襯字)1)나 어기사(語氣詞)를 덧붙이면서 악기로 반주한다.
시찬체는 장사(長沙) 등지에서 유행하였다. 문장식 구조는 ‘수래보(數來寶)’2)와 같다. 1인이나 2인이 연창하고 대나무판으로 반주를 맞춘다. ‘장사 쾌판(快板)’이라하기도 한다.
검양(黔陽)에서 유행하는 ‘연화뇨’는 악곡체에 속한다. ‘흥륭사(興隆沙)’라 부르기도 한다.
『청패류초·거지류·이아칠창연화락이행걸(李阿七唱蓮花落以行乞)』의 기록이다.
“거지가 대나무를 3촌 정도, 2쪽으로 잘라 줄로 그 끝을 묶고서는 손가락으로 비틀어 돌리며 소리를 낸다. 노래로 장단을 맞추는데 가련한 거지 신세를 한탄하거나 송축하기도 기도하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연화락’이라하기도 하고 ‘연화뇨’라고하기도 한다. 읊는 내용이 천박하고 비루하며 허황되고 무람없어 거의 다 귀에 거슬리는 말들이다.
소주(蘇州)에 이아칠이 있는데 유독 노래가 뛰어났다. 시내로 들어갈 때마다 상점 앞에서 노래 부르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다. 노래 부르라 초청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곧바로 영합해 줬다.”
 ‘연화락’을 하면서 구걸하는 기본 상황과 가지고 다니는 악기 형상은 알 수 있지만 각지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연화락’을 하면서 구걸하는 기본 상황과 가지고 다니는 악기 형상은 알 수 있지만 각지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북경에는 옛날에도 그런 거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연귀래이주인(燕歸來簃主人)’이 수집한 『연시부판쇄기(燕市負販鎖記)』의 기록이다.
“「연화락」을 부르며 판을 치는 것은 상등 거지다. 황문(黃門), 홍문(紅門)이라는 갖가지 명사를 가지고 있다. 설이나 명절이 올 때마다 각 상점의 문 앞에서 노래한다.
노래가 끝나면 반드시 수백 문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당을 불러 들여 문 앞을 에워싸 시끄럽게 노래하며 열흘 보름이 되도록 그치지 않는다. 이때 십 조(吊) 팔 조를 줘도 떠나지 않는다. 근래에 경찰청에서 움직이니 그런 악풍은 이제는 형체도 없이 소멸되었다.”
‘연화락’이 각지의 민간 곡예 곡종이 된 후에 민국시기에 이르렀어도 관례대로 구걸하는 방식이 계속됐음을 알 수 있다. 북경과 같은 그러한 큰 도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십불환(十不閑)3)하면서 구걸하는 방식
이런 구걸 방식은 늦어도 청나라 강희 연간(1662 ~ 1722)에 이미 북경 등지의 거리와 골목에 출현하였다.
 북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민간 예인 회화 『북경민간생활채도』 제24폭, 「소십불한걸개도(小什不閑乞丐圖)」의 제사(題詞)는 이렇다.
북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민간 예인 회화 『북경민간생활채도』 제24폭, 「소십불한걸개도(小什不閑乞丐圖)」의 제사(題詞)는 이렇다.
“이것은 중국 십불한 거지 그림이다. 분말로 밉상을 만들고 나무 상자에 작은 북, 대문 고리를 담아 치면서 노래한다. 동전을 얻으려는 것일 뿐이다.”
이른바 ‘십불한’은 간편하면서 신기하고 재미있게 만들어, 쉽게 움직이면서 공연해서 손님을 모으고 동냥하는 방법이다. 반주를 맞추며 말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한다.
이성진(李聲振)은 『백희죽지사(百戲竹枝詞)』에서 십불한을 ‘봉양부인의 노래(鳳陽婦人歌)’라고 하였다. 일리 있는 말일 수는 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일리 있다는 뜻은 형상, 방식이 ‘봉양(鳳陽)화고(花鼓)’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청나라 말기에 ‘십불한’을 ‘태평가사(太平歌詞)’라 하였다. 나중에 ‘십불한’과 ‘연화락’이 융합해 ‘분분연화락(紛扮蓮花落)’이라 불렀다. 그런 ‘분분연화락’은 바로 『북경민간생활채도』 중의 「소십불한」 이다.
청나라 말기에 ‘십불한’을 ‘태평가사(太平歌詞)’라 하였다. 나중에 ‘십불한’과 ‘연화락’이 융합해 ‘분분연화락(紛扮蓮花落)’이라 불렀다. 그런 ‘분분연화락’은 바로 『북경민간생활채도』 중의 「소십불한」 이다.
또 청나라 무윤불(繆潤紱)의 『심양백영(瀋陽白詠)』 제14수는 이렇다 :

“유등과 달이 서로 눈부시게 빛나며 팔관을 비추네. 반룡이 기예가 무르익으니 싸움에 능란하다. 징과 북 치며 야경을 도니 달구지 떠나고 떠들썩한데다 십불한이 더해지네.”
말미에 평어를 썼다.
“원소절 전후의 풍속에 따르면 본토박이들은 잡분, 용등, 사자놀이 등 여러 유희로 봄바람을 다툰다. 교묘한 춤과 맑은 노래는 일시에 각각 최고조에 이르렀다. 또 이른바 십불한을 하는 자가 있는데 품격이 하품이다.”
 ‘십불한 하는 자’를 ‘용등, 사자놀이 등 여러 유희’의 부류라, 본래 ‘속악, 속기’에 속하는 ‘하품’이라고 하였다. 이 말에서 당시 성경(盛京)의 거지들도 예전처럼 ‘함께 모여 떠들썩하게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십불한 하는 자’를 ‘용등, 사자놀이 등 여러 유희’의 부류라, 본래 ‘속악, 속기’에 속하는 ‘하품’이라고 하였다. 이 말에서 당시 성경(盛京)의 거지들도 예전처럼 ‘함께 모여 떠들썩하게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십불한을 하는 자’는 거지 부류에 속한 속기와 민속 오락을 기예로 하는 사람이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1) 친자(襯字), 운율(韻律)상 규정된 자수(字數) 이외에 가사(歌詞) 또는 가창(歌唱)의 필요에 의해서 덧붙이는 글자다. 예를 들면, 백모녀(白毛女)의 ‘북풍이 불어와 눈꽃이 휘날리네.’ 뜻인 ‘北風(那个)吹, 雪花(那个)飄’에서 ‘나개(那个)’가 바로 ‘친자(襯字)’에 해당한다.
2) 수래보(數來寶), 혹은 수백람(數白欖), 중국 특유의 곡예(曲藝)다. 예술표현 형식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혼자서 하거나 둘이서 함께 하기도 한다. 진행의 방식은 ‘낭독’ 방식이다. 낭독하는 내용은 일이 생기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나 현장에서 순간순간 반응하는 두 가지가 있다. 공연하는 사람은 매구마다 통하는 숫자, 박자, 유머를 적절히 섞는다.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청중을 즐겁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공연한다. 간단히 말해 장타령으로, 두 개의 골판이나 참대쪽에다 방울을 달고 그것을 치면서 하는 타령이라 이해하면 쉽다.
3) 십불한(十不閑, 혹은 什不閑(儿)), 잡기(雜技)의 일종이다. ‘연화락(蓮花落)’에서 발전해 이루어진 것으로 징·북·심벌즈 따위를 한 사람이 반주하면서 노래하는, 설창(說唱)의 한 가지다.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 대만 정치대학교 중문학과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자로 『선총원(沈從文) 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 『재미있는 한자풀이』, 『수달피 모자를 쓴 친구(선총원 단편선집)』, 『음식에 담겨있는 한중교류사』, 『십삼 왕조의 고도 낙양 고성 순례』, 『발자취-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가는 여정』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