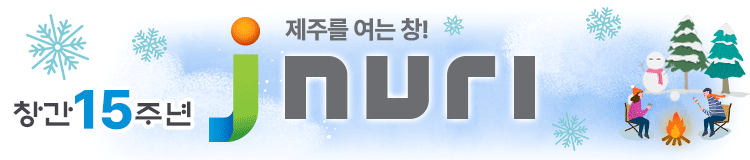현재 내몽고자치구에 속해있는 포두(包頭, 바오터우)의 옛 시가지역 초시가(草市街) 북쪽에 ‘자인구(慈人溝)’라는 지역이 있다. 근 반세기 이전에는 그 지방을 ‘사인구(死人溝)’라 불렀다. 본래 관을 놓아두던 곳이었다. 많은 거지가 그곳에 구멍을 파서 모여 살았다. 그래서 점차 포두의 유명한 빈민굴로 변했다.
청나라 말기 민국 초기에 그곳에 범인을 잠시 구류하는 ‘흑방(黑防)’이 있었다고 전한다. 포두(包頭)에서 체포한 범인과 오원(五原), 동승(東勝), 싸라치(薩拉齊) 뒷산 지역에서 압송해 온 범인은 모두 그곳으로 이송하여 구류했다가 다시 싸라치의 큰 감옥으로 호송하였다.
포두의 흑사회 조직 ‘양산(梁山)’의 대본영 ― ‘충의당(忠義堂)’ ― 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
‘양산(梁山)’이라는 말은 ‘쇄(鎖)’와 ‘리(里)’ 양 가문의 병칭이다. 어김없는 깡패 집단이었다. ‘쇄가(鎖家)’는 건륭 연간에 귀화성(歸化城) 공주부(公州府)에서 야경을 돌던 마삼홍(馬三紅)과 농사를 짓던 진사해(秦四海)가 창립했다고 전한다. 명나라 영락제 주체(朱棣)를 조사(祖師)로 모셨다.

마 씨, 진 씨 가문의 인원은 모두 취고수(구식 혼례나 장례식을 할 때의 악사)와 교자꾼이 골간이었다. 그들의 정상적인 생계 방식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끌어 모으는 것이었다.
각자 활동 근거지가 있었다. 근거지를 ‘방장(方場)’이라 부르고 어느 누구도 그 경계를 넘지 못했다. 예를 들어, 포두 ‘쇄가’의 방장은 동으론 사르친(莎爾沁)진, 서로는 마지(馬池)진, 북으로는 석괴구(石拐溝), 남으로는 대수만(大樹灣)까지였다.
이것이 홍방(紅幇)의 ‘반청복명(反淸復明)’〔청나라를 몰아내고 명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움〕 의식이 유래한 항방이다. 이렇게 추측한다.
“당시 옹정 황제가 자기의 통치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방회(幇會)의 ‘반청복명’의 민족혁명역량을 약화시키고 그의 종실과 가권에게 자기 의견을 알려 반대 되는 두 개의 하층 사회집단을 따로 조직하면서 분화되고 와해되었다.”〔유영원(劉映元)〕
‘리가(里家)’의 우두머리는 처음에 북경성 팔기 중에서 가난해진 왕야(王爺) 여덟이라고 전한다. 나중에 장(張), 고(高), 한(韓) 3문으로 나뉘었다. 리가의 성원은 모두 거지였다. 「연화락(蓮華落)」을 연주하거나 「수래보(數來寶)」를 부르며 구걸하면서 곳곳을 돌아다녔다. 범염(范冉)〔범단(范丹)〕을 조사로 모셨다.
 ‘쇄(鎖)’, ‘리(里)’ 양대 가문은 힘을 확대하려고 ‘양산(梁山)’과 합쳤다. 쇄 가의 각 고방(鼓房) 단장 중에서 양산의 우두머리를 천거했기에 ‘충의당’은 해당 고방에 설치했다. 문 앞에 ‘대행(大行)’이라 쓴 호두패(虎頭牌)와 소가죽 채찍을 걸어두었다. 당에는 ‘쇄’, ‘리’ 두 가문의 조사를 모셨다.
‘쇄(鎖)’, ‘리(里)’ 양대 가문은 힘을 확대하려고 ‘양산(梁山)’과 합쳤다. 쇄 가의 각 고방(鼓房) 단장 중에서 양산의 우두머리를 천거했기에 ‘충의당’은 해당 고방에 설치했다. 문 앞에 ‘대행(大行)’이라 쓴 호두패(虎頭牌)와 소가죽 채찍을 걸어두었다. 당에는 ‘쇄’, ‘리’ 두 가문의 조사를 모셨다.
우두머리가 밖을 나서면 호위가 따랐다. ‘괴정(拐挺)’이라 부르는 나무 몽둥이로 권력의 상징으로 삼았다. 평상시에는 괴정을 조사의 신탁 위에 놓아두었다. 그것을 이용하여 항방의 규칙을 집행하여 장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양산의 권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쇄가의 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평소에 리가의 거지는 모두 주어진 세력 범위 내에서 구걸하였다. 자기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잔치나 장례식이 있어도 동냥할 수 없었다.

현지에서 일반 집안에서 큰일이 생길 때에는 양산 사람을 청해서(실제로는 고용) ‘준문(蹲門)’, 즉 대문을 지키고 거지들이 오지 못하게 막았다. 하루에 은화 1원이었지만 떠날 즈음에는 구걸하지 못하고 양산에 남아있던 거지에게 1원을 더 얹어 주었다. ‘준문’하는 거지와 리가 거지는 고장(鼓匠) 막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탁상에 앉을 수 없습니다. 양산의 규칙을 어기게 되니까요.”
양산의 거지는 어떤 때에는 점포 취사장에게 탄 재를 퍼내주거나 개숫물을 버려주거나 하면서 남은 밥을 얻어먹었다. 생일, 회갑, 개업, 이사, 승진, 연말에 해당 집에 가서 축하노래를 불러주면 신선한 술과 음식을 얻을 수 있었다. 저녁이 되면 사인구로 돌아가 아편을 흡연하는 거지가 많았다.
평상시에 길거리에서 구걸할 때도 리가의 사람은 어렵지 않게 동냥할 수 있었다. 리가는 토비와 암암리에 결탁해 있었고 관부의 밀정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거지들에게 미움을 사서 재난을 초래할까 두려워했다.
다시 말해 양산 현지는 안팎이 결탁되어 있었다. 그들은 관부에 도적을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훔친 물건이나 돈을 도적과 나누었다.
외지에서 포두까지 도망쳐 온, 죄를 지은 도적은 먼저 양산에 가서 등록해야 했다. 야간에 도둑질하는 거지는 ‘빨간 줄 뛰는 자’라 불렀고 낮에 도둑질 하는 거지는 ‘청색 줄 뛰는 자’라 했으며 아침과 저녁에 도둑질하는 거지는 ‘등미(燈謎)놀이1) 하는 자’라 불렀다. 야간에 도둑질할 때 망을 보며 휘파람을 부는 거지를 ‘막대에 올라간 자’라 불렀고 집에 들어가 도둑질하는 거지는 ‘못에 뛰어는 자’라 했다. 장물을 나눌 때에는 후자가 전자보다 많이 가졌다.
낮에 도둑질하는 거지는 일반적으로 4부류로 나뉘었다. 상점 소매를 터는 거지를 ‘고매(高買)’라 하고 시장 행상인을 터는 거지를 ‘노점을 쓸다’라고 불렀다. 농민의 수레, 나귀바리를 터는 거지를 ‘바퀴 굴린다’라고 하고 큰길의 행인을 터는 거지를 ‘자루 집다’라고 했다.
등록된 여러 도둑질은 이 중에 하나만 할 줄 알면 되고 양산이 지정한 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됐다. 그렇지 않고 규칙을 위반하다가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발견되면 윗선에 보고되고 양산에서는 곧바로 사람을 보내 체포했다. 경범(예를 들어 초범)이면 곤장을 맞는 선에서 끝나지만 누범자는 사라치(薩拉奇)의 큰 감옥으로 보내졌다.

도둑이 현지에 발을 붙이려면 반드시 양산 기준에 맞는 약속을 받아들여야 했다. 도둑질한 장물은 3일 이내에는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됐다. 잃어버린 물건이 지방 세력자의 것이면 양산에서 분실물을 찾아내어 돌려줘야하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물을 판 후에는 30%를 꼭 양산에 헌납해야 했다. 이후에 우두머리가 경찰과 개인적으로 나누어 가졌다.

양산에 속한 거지 중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었다. 권법이나 봉술을 하는 사람, 본바닥 불량배 등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인간들은 다 모여 있었다.
당시의 공업계, 상업계, 경찰도 그 강호 세력이 현지 치안을 유지하는 것을 기꺼이 이용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 포두 전 지역의 순찰과 야경을 책임졌다. 밤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행인을 단속하고 심지어 체포할 수도 있었다.
성을 지키는 병사가 도박하려고 성 밖으로 나갈 때에는 성문의 열쇠를 그들에게 맡기기도 하였다. 그들도 야간을 이용해 성문을 열고 행상의 통행을 허가하면서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1) 등미(燈謎), 타호아(打虎兒), 문호(文虎)라고도 하는데 음력 정월 보름이나 중추절 밤, 초롱에 수수께끼의 문답을 써넣는 놀이다.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나와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중문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으로 『선총원(沈從文) 소설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한자풀이』,『제주관광 중국어회화』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