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막 길
오조리 41번길을 예전엔 소금막길이라 불렀다. 종달리보다는 못하지만 오조리에서도 소금을 생산했던 소금막이 있어서다. 지금은 흔적을 찾기 힘들다.


소금막길로 들어서는 입구에 퐁낭이 한그루 서 있고 누군가 나그네를 배려한 듯 쉬어가라고 쉼터 표지를 해 놓았다. 조촌 쉼터.
오조리를 조촌으로도 불렀는지도 모르겠다. 표지를 한 이가 조촌이라 표현했으니 그런가보다 한다.
잠시 앉아 쉬어본다.


PVC파이프안에 대나무를 끼운 정낭 하나가 귤밭을 지키고 있다. 그러고 보니 나들이에서 실지 쓰이는 정낭을 본 기억이 별로 없다. 그래서 더 반갑다. 원래의 세개가 아닌 한개짜리 PVC 정낭이어도.

길을 사이에 두고 두 집이 길가에 울타리인 양 동백나무를 심어 놓았다. 나무의 크기로 보아 심은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듯하다. 마주보는 두 집이 비슷한 시기에 심은듯 한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아직 지지 않은 동백꽃들이 꽤 많이 달려 있다. 빨간 꽃잎에 노란 꽃술은 강렬하다. 강렬함이 지나쳐 시들기도 전에 통째로 떨어진다. 아름다울 때 생명을 다하려고 작정한 듯이.

동백꽃은 강요배 화백의 작품 '동백꽃 지다'를 모티브로하여 4.3의 상징이 되었다.
예전엔 동백씨를 짜서 만든 동백기름이 집안마다 있었다. 볶지않은 씨에서 짜낸 것은 주로 머릿기름으로 사용했고 볶은 후 짜낸 것은 식용이나 약용으로 사용했다.
필자의 할머니가 생전에 아침마다 동백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단장해서 은비녀를 꼽으시던 모습이 생생히 떠오른다.

오조리 곳곳엔 물을 대어 논농사를 지었던 곳이 꽤 있다. 지금은 습지처럼 변해 갈대와 잡초가 우거져 있다.

마을 회관 밑에 용천수가 솟아나와 인근 논에 물을 대었다는 논물이다. 지금도 물이 솟아나고 있지만 버려진듯 안내판 하나없이 갈대 줄기들만 황량하다.



마을길에서 마주친 귤나무에 아직도 싱싱하게 귤이 매달려 있다. 찾아보니 '팔삭'이라는 품종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다. 봄이 다가오는 길목에 싱싱한 노란 빛 열매가 상큼하게 다가온 것 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오조리에는 군사 주둔지가 있고 방호를 위한 성곽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흔적이 맞는듯 하다.
일반 가정집 돌담을 저렇게 견고하고 높게 쌓을리 없으니까.
또한 성곽의 요철부분인 치성처럼 담이 이어지다가 돌출된 부분이 있는것으로 보아 확실해 보인다.
돌담에 아로 새겨진 연녹색 이끼가 지나온 세월이 짧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비어있던 가게 자리에 누군가 둥지를 틀고 작은 잡화점 가게를 열었다. 마을이 간직한 소박한 풍경을 해치지 않고서도 당당히 제 할일 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주인장일 것이다.
제주의 마을 안길을 걸으면서 마주하는 이런 가게들은 느낌이 참 좋다. 또한 이런 가게들이 잘 되었으면하는 마음도 간절하다. 다음에 이 길을 지날 땐 뭐라도 하나 사야겠다.

어느덧 여정의 시작이자 끝인 마을회관앞이다.
외상사절의 주인장 센스는 창고와 맞닿은 담벼락에 조그맣게 간판을 걸어놨다. '숙이네 수퍼'라고. 들어가서 음료수 하나 사먹어야겠다. 당연히 외상아닌 현금으로.

출발지인 마을 회관 앞엔 4.3때 베어질뻔 했으나 마을 주민의 반대로 살아남았다는 두그루 폭낭이 당당히 서 있어 마을을 지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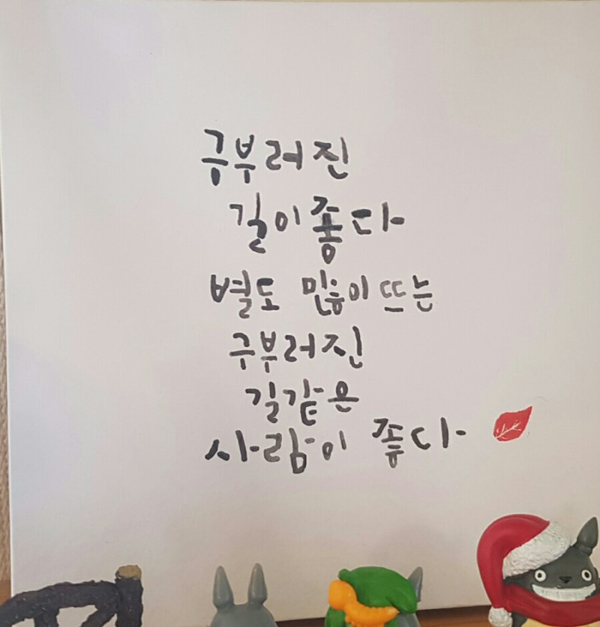
봄을 앞두고 따스했던 겨울 여정이 끝났다.
나들이가 주는 행복이 무한했던 하루이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 ☞김승욱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