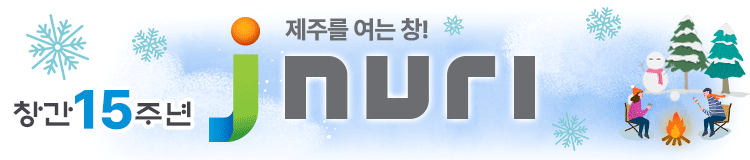영화 ‘다운폴’은 역사 고증에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 감독이 유독 다큐멘터리처럼 역사자료 사진과 똑같이 만든 장면이 있다. 히틀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하방공호에서 나와 ‘히틀러 유겐트(Hitlerjugend)’를 접견하면서 일일이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다. 우리말로 하면 ‛히틀러의 아이들’쯤 되겠다.
![염치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519/art_17467511225777_0782ee.jpg)
영화 내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변비환자처럼 찌푸린 히틀러의 얼굴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나마 옅은 미소가 번진다. 특히 소련군과 교전 중에 부상당한 독일군 10여명을 손수레를 이용해 구조한 페터 크란츠(Peter Krantz)라는 13살 소년에게 2급 철십자훈장을 달아주고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표정으로 소년의 볼을 꼬집어준다.
히틀러의 기(氣)를 제대로 받았는지 13살 소년 페터는 이후 대전차 로켓포로 소련군 탱크를 날려버리는 괴력을 발휘한다. 볼 한번 꼬집어 줄 만하다.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실명을 사용하는데 이 소년만은 실존인물이었던 알프레드 체크(Alfred Zech)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아마도 ‘촉법소년’ 나이라는 것을 배려한 모양이다.
사실 히틀러 유겐트 출신 중에는 얼마 전 선종(善終)한 프란치스코 교황 전임자였던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있고 전 서독 총리(1974~1982년)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도 있지만 그들의 히틀러 유겐트 경력을 문제 삼는 사람은 없다. 소년들의 잘못이 아니라 히틀러의 잘못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그 이름도 쟁쟁한 히틀러와 숱한 나치 장군들을 영화의 전면에 내세워놨는데도 감독이 특별히 13살 소년의 행적을 끝까지 추적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덴 나름의 이유가 있는 듯하다. 사실 이 소년 ‘알프레드 체크(영화 속 페터 크란츠)’의 문제는 후일 ‘뉘른베르크(Nrnberg)’ 전범재판 과정에서 전범들에게 내려진 ‘극형’의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실제로 1945년 베를린 공방전에 동원된 히틀러 유겐트 중 페터를 제외한 나머지 대원들은 마지막 포탄을 쏜 이후 모두 자살을 하거나 사살당한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나치친위대의 악명높은 독전대(Barrier Troops) 그라이프코만도(Greifkommando)가 등장한다. ‘독전대(督戰隊)’란 말은 한자로 표기해놓으면 그저 전쟁을 독려하는 것쯤으로 들리지만, 영어로 표기하면 말 그대로 ‘방벽(防壁) 부대’다.
그런데 그 방벽이 적군이 넘어오지 못하는 방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군이 후퇴하지 못하도록 방벽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들을 겨누고 있는 ‘그라이프코만도’의 총부리 앞에서 후퇴도 할 수 없었던 히틀러 유겐트 소년들은 모두 사살당하거나 ‘자살’당한 셈이다.
그라이프코만도는 나치가 패망하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점령지와 독일 본토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집과 징발, 그리고 불응 시 즉결처분하는 전쟁범죄에 앞장선 조직이다. 이들은 영화 속에서도 겁쟁이란 이유로 상관을 즉결처형하기도 하고, 징집을 거부하거나 도망치는 자국 민간인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현장에서 목매달아 죽인다.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면서 왜 그런 포퍼먼스를 펼쳤을까.[더스쿠프|뉴시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519/art_17467511221629_eee172.jpg)
페터는 요행히 살아남아 집으로 돌아갔지만 어머니는 그라이프코만도에 사살당하고 아버지는 교수형을 당한다. 페터는 그제야 나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베를린을 빠져나간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나치가 저지른 범죄 중에서도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 외에도 독전대 그라이프코만도의 만행에 당황한다. 기존 국제법으로는 이들의 죗값을 제대로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인륜을 저버린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라는 새로운 처벌 기준을 만든다.
뉘른베르크는 한마디로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죄를 물은 최초의 재판이다. 여기서 만들어진 새로운 기준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UDHR)’의 기초가 된다.
맹자를 흔히 ‘부끄러움의 사상가’라고들 한다. ‘인면수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갖춰야 할 덕목으로 ‘수오지심(羞惡之心, 부끄러움을 미워하는 마음)’을 제시하고 ‘염치(廉恥, 부끄러움을 살피고 신경 쓰다)’를 강조한다. 맹자는 「공손추(公孫丑)」에서 인간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다(無羞惡之心非人也·무수오지심비인야)라고 단언한다.
‘부끄러움의 사상가’로 동양에 맹자가 있다면 서양에는 니체가 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고대 페르시아 예언자)’의 입을 빌려 ‘인간에게는 수치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이 수치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Everyone needs a sense of shame, but no one ne eds to feel ashamed)’는 묘한 말로 우리의 머리를 망치로 때린다.
수치감이란 수치스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다. 그것이 수치스러운 짓이라는 것을 아는 ‘수치심’이 있다면 그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수치감을 느낄 일이 없다. 부끄러운 짓인 줄 알면서도 부끄러운 짓을 저질러놓고 부끄러워하는 인간은 니체의 관점에서 인간 자격 미달이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의 판결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전前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와 ‘이기고 돌아왔다’고 선언하고 ‘꽈잠(대학점퍼)’을 입은 청년들을 포옹하는 부끄러운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꽈잠을 입은 것인지 입혔는지는 잘 모르겠다. 전쟁에서 깨지고 베를린 지하벙커로 들어와서 히틀러 유겐트들만 골라 안아주는 히틀러를 연상시킨다.
![맹자는 부끄러움을 모르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고 단언한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519/art_17467511218314_bfb71d.jpg)
정말 이들이 영화 속 13세 히틀러 유겐트 페터 크란츠처럼 대전차포 메고 헌법재판소라도 날려주기를 바라는 것인지 궁금하다. 수치심도 없고 수치감조차 없는 모습에 보는 사람들만 대신 수치스럽다. ‘공연음란’이라는 것이 그렇다. 포르노 배우에게 부끄러움은 없다.
헌법재판소가 그를 ‘헌법위반’의 죄를 물어 파면했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그의 헌법위반보다 그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몰염치’가 어쩌면 더 당황스럽다. 뉘른베르크 법정이 히틀러와 나치에게 ‘인륜을 저버린 죄(Crimes against humanity)’라는 죄목을 새로 만들어 물었듯, 우리 법정은 그에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죄’라도 만들어 물어야 옳을 듯하다. [본사 제휴 The Scoop=김상회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