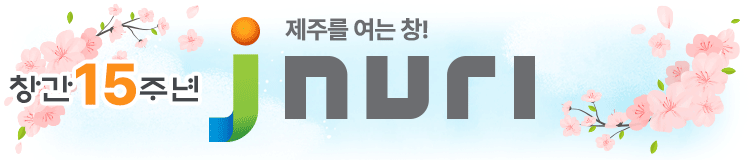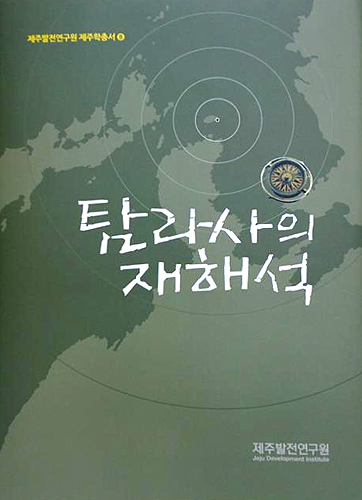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총서 8호로 발간된 『탐라사의 재해석』은 9명의 집필자가 참여해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초점을 두고 주제에 따라 근현대를 아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韓·耽別祖論(한·탐별조류)과 耽羅(탐라)의 文化主權(문화주권)은 전경수 서울대 교수가 ▶‘제주(濟州)’의 옛 이름 재해석은 오창명 언어와문자연구소 소장이 ▶탐라왕 및 성주·왕자의 실체와 탐라의 통치체제는 김창현 고려대 교수가 ▶고고유물(考古遺物)을 통해본 탐라(耽羅)의 대외교역은 김경주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실장이 ▶송당 당신본풀이와 서복전설을 통해본 탐라사 재해석은 현승환 제주대 교수가 ▶탐라와 몽골문화의 교류와 탐라사회의 변화는 김일우 제주대 강사가 ▶탐라유적의 종합 고증은 홍기표 성균관대 교수가 ▶해양교류로 본 탐라사는 윤명철 동국대 교수가 ▶지중해, 해상왕국 크레타는 김은석 제주대 교수가 각각 맡아 집필했다.
특히 사료에 바탕을 두고 실증적 접근을 한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이뤄졌다.
고려 중엽까지 사용됐던 ‘탐라’와 그 이후 사용된 ‘제주’의 역사적 의미 제고를 통해 명칭 변화에 따른 제주지역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순덕 책임연구원은 “20세기 후반부터 지역성이 강조되면서 제주지역에서는 제주의 역사 찾기를 통해 ‘탐라’와 ‘탐라국’의 실체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대두됐다”며 “그러나 역사는 실증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탐라시대의 다양한 문물제도와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을 통한 규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문화적․역사적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탐라사의 재해석』은 역사적 고정관념을 전환하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향후 탐라사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정치, 경제, 문화 등)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문의 : 제주발전연구원(064-726-0500)
□원문은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