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준만 교수는 <오버하는 사회>(인물과사상사, 2003년)를 쓴 바 있다. 지금도 시의적절한 지는 좀 더 따져봐야하겠지만 여전히 좋은 책이다. 인터넷에 소개된 내용은 이렇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 사회, 언론, 문화 영역 가릴 것 없이 오버(Over)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을 그럴 듯한 명분으로 미화하지만, 그 열정의 이면과 표면에 어른거리는 오버의 실체에 대해서는 둔감하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사회와 개인에 필요한 열정이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열정을 넘어 과도한 오버로까지 치닫는 자기독단과 아집에 대해 비판한다. 크게 바뀐 환경에서도 '오버'를 요구하는 반(反)독재 투쟁의 심성이 남은 것을 지적하는 정치의 '오버'를 비롯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오버'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 등을 담고 있다.”
‘질풍노도의 시대’는 사춘기로서 족하다. 물론 엄마들은 “내가 미쳐...”하겠지만 사춘기의 오버는 한편 귀하고 예쁘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절, 성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의 관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대학생 때 선배가 ‘관념적 과격성’을 비판한 적이 있다.
뭔가 멋진 말인 것 같았다. 지금 생각해 보니 오버하지 말라는 소리였다. 보수든 진보든 종교든 여성주의든 아무튼 멋진 이념 할아비든 ‘오버’는 추하다. 성인이 매사에 오버를 한다면 ‘경계선 인격 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를 의심해 봐도 좋다.
김혜남 선생님은 정신분석가다. 전공의 시절, 내 정신치료 슈퍼바이저였다. 선생님은 ‘경계선 국민’(?)이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엔가 칼럼을 기고했는데 게재되지 않았다. 신문사에서 밝힌 거절의 요지는 독자들이 싫어할 내용이란 거다. 당시 난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선생님이 순진하다고 놀렸다.
그런 글을 실어주리라 생각했냐고 말이다. 언론은 언제나 국민을 우상화한다. 언론 자신은 그 ‘위대한’ 국민을 대변하여 말하는 정의의 기사 코스프레다. 거기에다 대고 위대한 국민이 아니라 ‘경계선 국민’ 운운하며 비판해댔으니, 언론이 그 글을 싣는다면 장사꾼이 고객을 호되게 비판하며 물건을 팔겠다는 심보나 다를 바 없다. 강준만 교수처럼 ‘자가 출판’하면 모를까.
늦은 밤, 친구J와 꼼장어 깡통구이 집에 갔다. 아마 3차다. 손님이라곤 우리 밖에 없었다. 그와 술 마시며 이야기하다 바닥에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종업원에게 “여기 젓가락 한 벌만 가져다 주세요.” J는 나보고 ‘갑질’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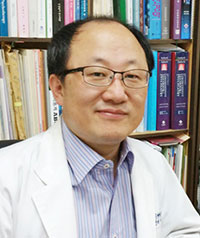
특종, 단독 보도하는 언론으로서 김어준은 귀한 존재다. 총수, 아니 교주 오버도 유쾌하다. 연출한 개그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문제는 간혹 다큐를 진지하게 오버할 때다. 다큐 오버는 단순히 추한 걸 넘어 사회 악덕이 되어 버린다. J는 최근 김어준의 파파이스를 즐겨 듣는다던데 혹시 그 영향을 받은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이미 많이도 마셨지만 술자리는 내가 화를 내며 끝나버렸다.
오늘 아침에 J가 문자를 보내왔다. "어제는 미안...말도 안되는 갑질 이야기...“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다.
| 이범룡은?
|






































